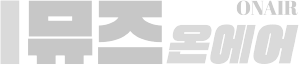![사진 :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 포스터 [그린나래미디어(주)]](http://www.museonair.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283769322_066e5f.jpg?iqs=0.27224373765642773)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신작 <그저 사고였을 뿐>은 칸영화제 경쟁부문 초청과 황금종려상 수상으로 국제적 주목받으며 영화적 업적과 문화적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최근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하며 한국에서도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으로서 BIFF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되어 상영되었으며, 감독의 수상은 이란 정부의 검열에 맞서 예술적 자유를 추구해온 그의 투쟁과 <그저 사고였을 뿐>의 사회적 메시지가 국제적으로 공감받았음을 방증한다.
"억압된 기억을 직시하는 도발적 기록"이라는 평단의 찬사처럼, 영화는 개인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정의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객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복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기억은 진실인가?"라는 물음은 SNS와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며, 예술영화 팬뿐 아니라 인문학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사진 :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 스틸컷 [그린나래미디어(주)]](http://www.museonair.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283757408_31c846.jpg?iqs=0.7501239441830637)
영화는 어둠 속 도로에서 개를 치는 사고로 시작된다. 임산부 아내와 딸을 태운 남자 에그발(주인공)은 사고 직후 수리소에서 바히드(추적자)를 만난다. 바히드는 에그발의 절뚝거리는 걸음과 보철의 삐걱거림에서 과거 고문관이었던 '페그 레그'의 흔적을 감지한다. 에그발이 납치되어 사막에 감금되는 동안, 바히드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감각적 단서를 통해 그의 정체를 추적하지만 확신을 얻지 못한다. 증언자들의 충돌과 감각적 단서의 불일치는 "누가 진짜인가?"보다 "우리는 왜 그렇게 믿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부각시킨다.
![사진 :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 스틸컷 [그린나래미디어(주)]](http://www.museonair.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283751132_aa05c1.jpg?iqs=0.3601518724275461)
영화는 기억이 신체적 감각과 연결됨을 강조한다. 바히드가 에그발을 추적하는 근거는 시각적 증거가 아닌 걸음걸이 소리, 보철의 마찰음 등 감각적 단서들이다. 이는 기억이 논리적 재구성이 아닌 몸의 경험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은 단편적이고 왜곡되기 쉽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에그발의 주장은 '확실한 진실' 대신 '가능성의 진실'을 남기며, 관객은 불확실성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내몰린다.
![사진 :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 스틸컷 [그린나래미디어(주)]](http://www.museonair.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283744869_db2b17.jpg?iqs=0.44311404814174304)
영화는 복수를 단순한 응징이 아닌 심리적 안도감과 새로운 폭력의 위험으로 그린다. 바히드의 확신 없는 추적과 하미드의 분노는 정의 구현의 모순을 드러낸다. 복수의 순간은 이성적 판단과 감정의 경계에서 뒤틀리며, 이는 관객에게 판단의 위험성과 도덕적 죄책감을 환기시킨다. 영화는 복수 외에 연대와 증언의 공유라는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회적 치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사진 :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 스틸컷 [그린나래미디어(주)]](http://www.museonair.co.kr/data/photos/20251043/art_1760928376348_bd1b60.jpg?iqs=0.024910298722482294)
파나히 감독은 미니멀리즘을 통해 강렬한 감정적 울림을 창출한다. 좁은 밴 내부, 사막의 적막, 밤길의 어둠은 고통과 기억이 응축된 공간으로 기능한다. 카메라는 인물과 밀착해 보철의 떨림, 자동차 엔진 소리 등을 포착하며, 음향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로 활용된다. 자연광과 그늘을 활용한 조명은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드러내며, 다큐멘터리 같은 날것의 화면은 현실감을 더한다. 감독은 정답을 제시하는 대신 관객을 '문제 해결자'가 아닌 '질문하는 자'로 남겨둔다.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은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 고문, 억압된 기억 등과 맞닿아 있다. 영화는 개인적 상처가 사회적 기억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진실과 정의는 법적 판결이 아닌 기억의 공유와 증언의 용기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피해자들의 연대와 공동체적 책임은 복수의 서사를 넘어 치유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 영화는 안정적 해답을 거부한다. 복수, 정의, 기억, 진실 사이에서 관객은 판단의 동반자가 되어 스스로 답을 모색해야 한다. 파나히는 말한다. "우리가 믿는 진실은 얼마나 공고한가? 복수의 정당성은 누가 결정하는가?" 이 질문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거 청산과 정의 실현의 문제를 상기시킨다. 영화는 끝났지만, 질문은 관객의 몫으로 남는다.
사진 :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 포스터 및 스틸컷 [그린나래미디어(주)]